[기자의 책갈피]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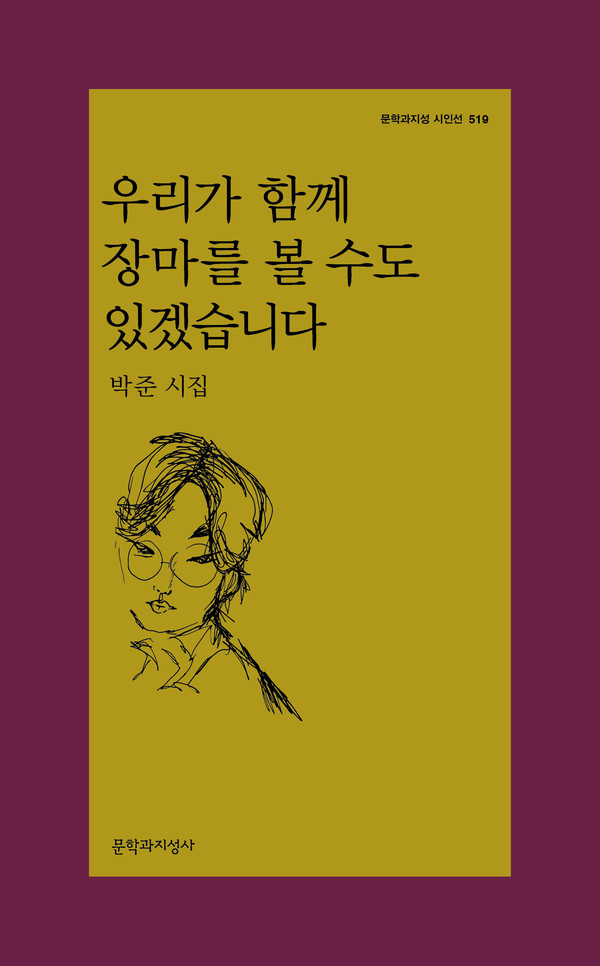
그해 우리는 서로의 섣부름이었습니다, ‘선잠’. 작가는 자신의 삶에서 큰 행복이나 불행일 수 있는 순간을 타인에게 고작 ‘섣부름’이란 단어로 소개한다. 이 대목에서 작가가 일상을 얼마나 일상답게 받아들이고 즐겼는지 알 수 있다. 섣부름이란 때론 어설프지만 애틋하고, 익숙하지 않지만 뜨겁도록 열정적이다. ‘우리’의 끝이 뿌리 깊은 나무일지, 심은 지 하루 채 되지 않은 나무일지 아무도 모른다. 하지만 끝엔 사랑이 남았다. 미련이 없었기에 이런 울림의 글을 적었으리라 생각한다. 더해야 할 말도 덜어낼 기억도 없는 그해 여름의 일입니다, ‘여름의 일 - 묵호’.
강주은 기자
smpkje104@sm.ac.kr

